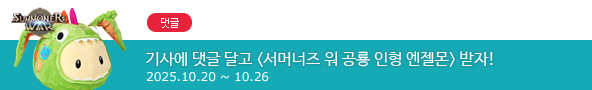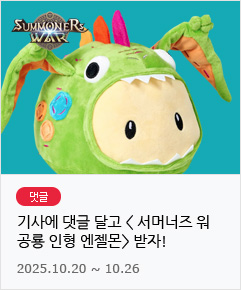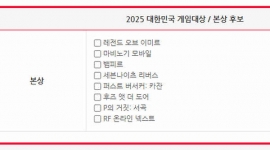※ [순정남]은 매주 이색적인 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게임이나 캐릭터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금은 EA FC로 이름을 바꾼 EA의 축구게임 피파 사커.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시리즈를 이어가며, 이제는 현실과 거의 흡사한 그래픽과 조작감으로 누구도 넘보지 못할 축구 게임 1황 자리에 올라섰다. 하지만 과거엔 아니었다. 특히 위닝 일레븐(현 e풋볼) 시리즈와 축구 게임계 정상을 놓고 다투던 2000년대에만 해도, "피파는 아케이드, 위닝은 사실성"이라는 말이 나오곤 했다. 당시만 해도 피파는 현실 축구와 거리가 먼 재미 위주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출시된 초기 피파 시리즈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다소 비현실적인 요소들로 가득했다. 축구 규칙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던 당시 하드웨어적 한계를, 유쾌한 아케이드성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저게 피파야?'라고 놀랄 만한 장면들도 많은데, 그중 가장 황당하고 재미있는 특이점들을 모아봤다.
TOP 5. 1P는 키보드 2P는 마우스
축구게임은 혼자 할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재미있다. 그래서 피파 온라인(현 FC 온라인)이 인기가 많고, 패키지 피파 시리즈 역시 온라인 모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인터넷 환경과 PC/콘솔 역량이 받쳐주지 못하던 옛날엔 온라인 대전을 즐기기 어려웠다. 당시에는 누군가와 같이 플레이하려면 한 기기와 한 화면을 공유하며 나란히 앉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치 오락실처럼 말이다.
콘솔이야 보통 컨트롤러가 두 개씩 있으므로 상관없었지만, PC버전의 경우 전용 컨트롤러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해 2P 플레이를 지원해야 했다. 한 키보드를 좌/우로 나눠 두 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지만, 당시 대부분의 키보드는 멤브레인 방식이라 여러 키가 동시에 입력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A는 피파 96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바로 2P 플레이어는 '마우스'로 조작하게 하는 것이다. 커서 위치에 따라 선수가 움직이고, 커서와의 거리가 멀수록 빠르게 뛰게 했다. 나름 혁신적인 시도였지만 무지하게 어려웠다는 것은 함정이다.

TOP 4. 키퍼가 골킥 찰 때 앞에서 얼쩡거리면 맞고 골로 연결
현대 축구게임에서 골키퍼의 골킥이나 일반적인 패스는 바로 앞에서 막지 못하도록 설정된 경우가 많다. 실제 축구라면 상대방이 공 앞을 막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 패스를 날리는 모자란 골키퍼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 앞에서 서성거리는 공격수도 없을 것이고 말이다. 따라서 골킥을 할 때는 바로 앞에 서 있지 못하거나, 공이 몸을 통과하는 등의 효과가 적용된다.
하지만 피파 94(인터내셔널 사커)에서는 필드 플레이어가 상대편 골키퍼 앞에 서 있다가 골킥을 몸으로 막을 수 있었다. 골킥을 찰 때 앞에서 알짱거리면 공이 몸에 맞고 튕겨져 나와 골이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당시 허술했던 AI의 허점을 이용한 '공식적인' 공략법으로 나름 유쾌하게 받아들여졌다. 물론 플레이어 간 대결에서는 써서는 안 될 비기였지만 말이다.

TOP 3. 등번호는 사치다
현대 축구게임에서 각 선수들의 모습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헤어 스타일이나 키, 덩치, 피부색, 스타일, 심지어 얼굴 모양까지 다양한 개성을 보고 선수들을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등에 크게 박혀 있는 등번호는 선수의 개성을 나타내는 최대 아이덴티티다. 실제 축구 경기에서도 카메라가 멀리서 잡힐 경우 선수들의 얼굴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등번호를 통해 어떤 선수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피파 97 이전까지 피파 시리즈에는 등번호가 없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해상도와 용량 문제다. 당시엔 대부분의 선수들이 같은 캐릭터 모델링을 사용했고, 팀에 따라 색상 변환 정도만 적용했다. 94와 95는 해상도가 낮은 2D였던데다 PC의 경우 플로피 디스크에 담겨 나왔기에 등번호를 우겨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CD로 저장 매체를 바꾼 96에서도 유니폼만 다를 뿐 등번호는 없었다. "난 손흥민을 좋아하니까 7번을 달거야" 같은 꿈은, 당시 게임에선 꿀 수 없었던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TOP 2. 공과 관계없는 백태클은 경고나 퇴장 없음
피파 98까지만 해도 게임 내에는 '킬 태클' 기능이 있었다. 이름조차 무시무시한 이 기술은 상대 선수에게 높은 확률로 부상을 입히는 태클로, 보통은 레드카드. 잘해야 옐로카드를 받았다. 이를 활용하면 최약체 선수를 퇴장시키고 상대편 에이스를 부상시키는 받고 베컴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적인 플레이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킬 태클에도 허점이 있었다. 공을 가진 선수가 아니라 뒤에서 쫓아가는 선수에게 백태클을 날려도 경고나 퇴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팀 에이스 선수가 공을 잡고 우리 진영으로 오고 있을 때, 뒤에서 슬라이딩 태클을 계속해서 날려도 심판은 그냥 지나쳤다. 공을 가진 선수에게만 반칙 여부를 따졌기 때문이다. 한편, 피파 2000에서는 버그성 플레이로, 킬 태클을 3번 이상 연속으로 하면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고 경기를 계속 진행했다. 그래서 골키퍼에게 몇 번 태클을 걸면, 세 번째 태클에서는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아 공을 뺏어 골을 넣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다.

TOP 1. 카드 안 받으려고 심판 피해 무한 도망다니기
실제 축구도 그렇지만 반칙을 저지르면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카드를 준다. 보통 이럴 때 심판은 반칙을 저지른 선수 앞에 가서 카드를 높이 치켜든다.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이 선수가 카드를 받았어요'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꼭 심판이 선수 앞에 가야만 카드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름만 적으면 되니까. 심판을 피해 다니면 오히려 불손한 행위로 여겨져, 경고에서 끝날 것이 퇴장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초창기 피파에서는 심판이 선수 앞에 가지 않으면 카드를 못 줬다. 휘슬이 울리면 심판이 뛰어와서 선수 근처에 가야 카드를 주는 액션이 발동했는데, 문제는 휘슬이 울린 후 심판이 올 때까지 선수 컨트롤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선수가 뛰어서 심판을 피해 도망 다니면 카드를 주지 못했다. 마치 술래잡기처럼. 맘먹고 도망 다니면 10분이건 1시간이건 심판과 술래잡기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물론 잡히면 얄짤없이 카드를 받았지만 말이다. 지금은 당연히 휘슬이 울리는 순간 컨트롤이 막히기에 불가능한 장면이지만, 그땐 이런 낭만적인 술래잡기가 펼쳐졌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
- [순정남] 한국을 싫어하는 듯한 게임사 TOP 5
- 소녀전선 3인칭 슈팅 신작, 23일 소프트런칭
- "안 어울려" 오버워치 2 원펀맨 2차 컬래버 혹평
- [오늘의 스팀] 오리로 하는 타르코프, 신작 ‘덕코프’ 인기
- “퍼블리셔 알아서 구해라” 엔씨 택탄 자회사 75% 정리
- [오늘의 스팀] 몬헌 와일즈, 패치 2주만에 '동접 반토막'
- [기승전결] 엔젤우몬! '디지몬 스토리' 신작에 팬덤 대만족
- 20년 넘게 이어져온 PC 카트라이더, 끝내 문 닫았다
- [이구동성] 엔씨 “택탄은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 출시 한 달 만에 20% 할인 시작한 보더랜드 4
게임일정
2025년
10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