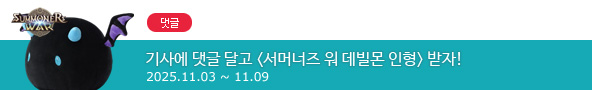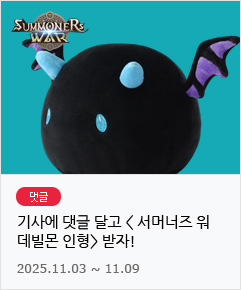'밸브 타임', '소통 부재', '3을 세지 못하는 회사', '게임을 만들지 않는 게임 회사'.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밸브 코퍼레이션에 붙은 부정적 별명들이다. 역사에 비해 출시된 게임 수가 많지 않고, 신작 소식도 적고, 미디어 노출도 거의 없다시피 한 데다가,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 관리도 속 시원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붙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별명들이다.
최근 기자는 스팀 덱 국내 출시를 맞아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밸브 코퍼레이션에 방문해 여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위의 모든 별명들이 나오게 된 이유와 밸브를 둘러싼 여러 의문들의 해답을 단 하나의 키워드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바로 밸브 특유의 회사 운영방식과 문화다.
밸브의 회사 문화이자 운영 방식은 '극한까지 이른 수평적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밸브 내 모든 직원들은 직책도 직위도 없다. 연차와 상관없이 신입부터 베테랑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과 권리를 지닌다. 이는 사장으로 알려진 게이브 뉴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직원은 원할 때 언제나 게이브 뉴웰과 자유롭게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게이브 역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요청받지 않은 의견을 함부로 제시할 수 없다. 회사 문화가 개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게임업계를 통틀어도 이례적일 정도로 독특한 풍경이다.
여담으로 밸브의 몇 가지 더 특별한 문화를 설명하자면 이 회사는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찾아서 해야 하며, 프로젝트는 대부분 소수 정예로 진행된다. 일례로 다른 회사였으면 수백 명이 달라붙었을 법한 대형 프로젝트인 스팀 덱도, 겨우 20명 남짓한 직원들이 사무실 한켠에서 개발했다. 이 인원들은 기기 설계와 디자인은 물론, 패키징 디자인, 보도자료 작성, 언어 지원까지 자잘한 업무를 모두 직접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리더 같은 직책도 따로 없다. 다 같이 으쌰으쌰 힘내서 하나의 크고 작은 목표를 위해 달려 나가는 셈이다.

얼핏 보면 일하기도 좋고, 회사 분위기도 좋을 것 같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맞는 말이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사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좋으며, 다들 이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에 만족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수평적인 구조로 인해 생기는 단점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의사결정 난이도 상승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의 의견이 동일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이다. 스팀 덱의 햅틱 패드 모양을 동그라미로 할지 네모로 할지에 대한 아주 단순한 내용은 물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게임의 수익성, NFT 도입 등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의사결정은 직원 간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결정된다. 누구 한 명의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위에서 말한 '밸브 타임'이 발생하는 이유도,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는데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쌓이고 쌓여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유저들의 작은 요청 하나에도 대응이 늦는 것도, CS를 담당하고 있는 팀원끼리 숱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리더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다른 회사 입장에선 꽤나 비효율적인 풍경처럼 보이기도 한다.
게임 개발이 늦어지거나 미디어 노출이 적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 것부터, 음향, 코딩, 난이도 등 모든 면을 프로젝트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해가며 진행하다 보니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미디어 노출도 많을 수가 없다.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그렇다면, 이 문화를 경우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밸브에서는 직원부터 경영진까지 회사의 현 운영구조와 문화를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로 생각하고 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회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밸브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지사를 잘 만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 지사에 밸브의 운영 문화를 녹여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변호사나 마케팅 담당자처럼 사업적 측면에서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해야 하는 인원은 따로 기용을 한다는 점이다.
하루빨리 신작을 보고 싶은 게이머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문화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밸브가 양질의 완성도 높은 게임과 플랫폼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비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밸브가 출시한 게임들 대부분이 여지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던 것을 생각하면, 밸브가 이런 기조를 고집하는 데에는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런 밸브의 운영구조와 문화를 똑같이 따라하자거나 본받자는 뜻은 아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일장일단이 있고, 밸브의 체계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밸브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과 결과물들로 미루어 보면,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밸브 직원들 모두 스스로 '항상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했으니, 조만간 신작과 같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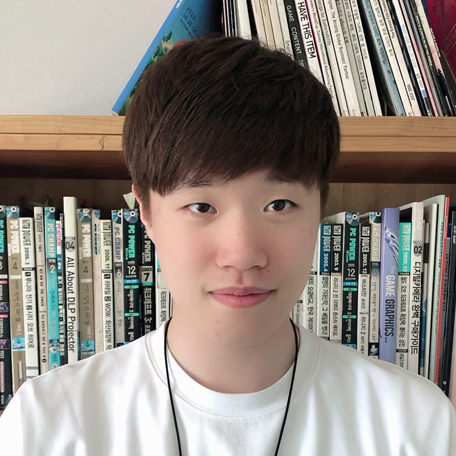
게임메카에서 모바일게임과 e스포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동생에게 잔소리하던 제가 정신 차려보니 게임기자가 돼 있습니다. 한없이 유쾌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담백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남기고 싶습니다.bigpie1919@gamemeca.com
- 팰월드 저격 실패, 닌텐도 ‘몬스터 포획’ 특허권 기각
- 단간론파 느낌, 마법소녀의 마녀재판 제작진 신작 공개
- GTA 느낌, 저스트 코즈 개발자의 오픈월드 신작 공개
- 연말연시 목표, 테라리아에 공식 한국어 자막이 추가된다
- [기자수첩] 엔씨소프트의 ‘내로남불’ 저작권 인식
- 채널당 수용 인원 1,000명으로, 메이플랜드 2.0 만든다
- 함장 중심으로 전개, 카제나 메인 스토리 전면 개편한다
- 플레이어언노운 신작 ‘고 웨이백’, 11월 20일 출시
- ‘쌀먹세’ 생기나? 국세청 아이템 거래 업종코드 신설한다
- [오늘의 스팀] 한·중·일 지역 추가된 크킹 3, 관심 급증
게임일정
2025년
11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